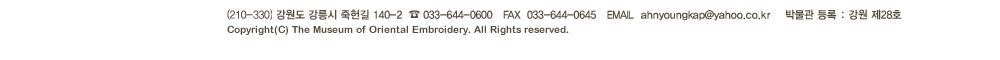АИЊ СіПЊПЁМИИ КМ Мі РжДТ АИЊ РкМі КИРкБтДТ АэРЏРЧ ЕЖУЂРћРЮ СЖЧќРЛ ЧЅЧіЧЯАэ РжДй.
РЬ СЖЧќРК АэТїПјРћ ММАшИІ ЧЅЧіЧпДйДТ СЁПЁМ ЙЮШ ШСЖЕЕПЭЕЕ ЛѓХыЧбДй.
УЄЛіКаМЎРЛ ХыЧи СЖБн Дѕ РкММШї ЕщПЉДйКИЕЕЗЯ ЧбДй.
АИЊКИРкБтИІ ОЦДТ ЛчЖїРК РжСіИИ, И№ИЃДТ ЛчЖїРЬ Дѕ ИЙНРДЯДй. И№ЕЮАЁ ВЩАњ ЛѕЖѓАэ КЮИЃСіИИ, РкМіЗЮ ИИЕч НЧПыРћРЮ КИРкБтПЉМ РлЧАРЬЖѓ ПЉБтСі ОЪНРДЯДй. РкМіДТ МіАјПЙЧАРЬЖѓ ЙЮМгЧАРИЗЮ ФЁКЮЧЯАэ ИЛСіИИ БзЗИАд АЃДмЧЯСі ОЪНРДЯДй. ПьИЎАЁ ЙЮШЖѓАэ КЮИЃДТ 19ММБт РќЙнюякѕ~20УЪПЁ АЩУФМ УтЧіЧб ШИШДТ РЬЙЬ ЧЪРкАЁ ЙрЧћЕэРЬ ПьИЎГЊЖѓ ЧбБЙ ШИШЛчРЧ БнРкХОРЬЖѓ Чв Мі РжСіПф. АэБИЗС ЙЋД§ КЎШПЁМ ОЦЙЋЕЕ ЧЎСі ИјЧпДј БтШЃ ААРК СЖЧќЕщРЛ ЧЪРкАЁ УГРНРИЗЮ ЧиЕЖЧЯПЉ ЧиМЎЧЯАэ Бз ГЛПыРЛ ЙйХСРИЗЮ АэЗСКвШПЭ СЖМБКвШИІ УГРНРИЗЮ ПЯКЎШї ЧиЕЖЧЯПДРИИч БзЗБ ДйРНПЁ ЙЮШАЁ КёЗЮМв КИПЉ ЧиЕЖЧЯАэ ЧиМЎЧв Мі РжРЛ ИИХ ЙЮШДТ 2,000Гт РќХыРЛ ИгБнАэ РжБтПЁ ОЦЙЋГЊ ЙќСЂЧв Мі РжДТ БзИВРЬ ОЦДеДЯДй.
ШСЖЕЕДТ ДмСі ВЩАњ Лѕ БзИВРЬ ОЦДб АэТїПјРЧ РлЧА
СІ ПЌРчПЁМ ДйЗчДТ ШСЖЕЕ ЙЮШДТ БУСпШИШРЧ РЬИЅЙй ШСЖЕЕПЭ СжСІАЁ ААОЦ ЧдВВ ДйЗчАэ РжСіИИ ЧЅЧіЙцЙ§РК РќЧє ДйИЃАэ, ОЦЙЋАЭЕЕ И№ИЃДТ МЙЮРЬ БзИА БзИВПЁДТ ЛѓТЁРЬ АсПЉЕЧОю РжОюМ БзЗБ БзИВАњЕЕ БИКАЧЯПЉОп ЧеДЯДй. ЙЮШДТ ШПј УтНХРЬГЊ ШНТРЬ РЯСЄЧб АэСЄЕШ БдЙќПЁМ ЙўОюГЊ РкРЏКаЙцЧЯАд РкНХРЧ ЧЅЧіРЧСіИІ ИЖРНВЏ ЙпШжЧЯСіИИ ЙЮШРЧ ЧЅЧіПјИЎДТ ЙнЕхНУ СіХАДТ БзИВЕщРЛ ИЛЧеДЯДй. БзЗБЕЅ ПфСюРН БУСпШИШПЭ ЧдВВ ДйЗя ХЋ ШЅЖѕРЬ РЯОюГЊАэ РжРИИч, БУСпШИШ ААРК ДыРлРЛ И№ЛчЧиОп АјИ№РќПЁМ ХЋ ЛѓРЛ ЙоАэ ДчРх ЙЮШРлАЁЖѓ КвИГДЯДй. БзЗЏГЊ 1918Гт 10ПљКЮХЭ СіБнБюСі ПЌРчЧиПТ <ЙЮШ ШСЖЕЕ>ДТ ДмСі ВЩАњ Лѕ БзИВРЬ ОЦДЯЖѓ <ИИЙАЛ§МКЕЕиПкЊпцрїгё>ЖѓДТ АэТїПјРЧ БзИВРгРЛ СѕИэЧи ПРАэ РжНРДЯДй.
БзЗБЕЅ ЙЮШПЭ КёБГЧЯДТ ЖЧ ДйИЅ РхИЃАЁ РжРИДЯ ЙйЗЮ <ВЩАњ Лѕ> РкМіРдДЯДй. РкМіЗЮ ИИЕч КДЧГРЛ КИИщ СжСІДТ ЙЮШ ШСЖЕЕПЭ ЖШААНРДЯДй. ДйИИ БзИВРЬ ОЦДЯОюМ ЧдВВ ДйЗчСі ОЪРЛ ЕћИЇРдДЯДй. БзЗЏГЊ <АИЊ РкМі КИРкБт>ДТ ДйИЈДЯДй. АИЊСіПЊПЁМИИ КМ Мі РжДТ ЕЖЦЏЧЯАэ ЕЖУЂРћРЮ СЖЧќРЛ ЧЅЧіЧЯАэ РжНРДЯДй. Бз БюДпРК ОЫ Мі ОјДТ МіМіВВГЂРдДЯДй. СіБнБюСі ШСЖЕЕИИ ДйЗчОюПРДйАЁ АИЊ РкМіКИРкБтИІ КИДЯ РЬЙЬ РќПЁЕЕ ОЫОЦКИОвСіИИ ИХПь УцАнРћРЮ СЖЧќРИЗЮ ДйАЁПдНРДЯДй. РЬ АИЊ РкМі КИРкБтДТ ЧиПмРЧ РЏИэШАЁЕщ, ПЙИІ ЕщИщ ЦФПя ХЌЗЙ(Paul Klee)РЧ РлЧАЕщАњ КёБГЧиКИОЦЕЕ СЖЧќАњ БИМК ИщПЁМ КИДй ЖйОюГГДЯДй.
ЙЮШДТ ММБтИЛРЧ ЧбБЙШИШ
ШИШЛч РќАјРкЕщРК ЙЮШИІ РаОюГЛСі ИјЧеДЯДй. РЬЕщРК СжЗЮ СЖМБНУДы ЙЎРЮШИІ ДйЗчБт ЖЇЙЎРдДЯДй. ЙЎРЮШДТ ПьИЎГЊЖѓ РќХыАњ АќАшАЁ БзИЎ БэСі ОЪСіПф. СЖМБ ЙЎРЮШДТ Бз ДчДыРЧ СпБЙРЧ ЙЎРЮШПЭ АќЗУРЬ РжРЛ ЛгРдДЯДй. БзЗЁМ АэБИЗС КЎШ, АэЗС КвШ, СЖМБКвШИІ РќЧє РаОюГЛСі ИјЧЯБт ЖЇЙЎПЁ ЙЮШИІ РаОюГЛОю ЧиМЎЧв Мі ОјНРДЯДй. ШИШЛч РќАјРкЕщРЬ ОД ЙЮШПЁ ДыЧб ГэЙЎРЛ РаОюКЛ РћРЬ РжНРДЯБю. ШчШї РлАЁИІ ИєЖѓМ ШИШПЁМ ДйИІ Мі ОјДйАэ ИЛЧеДЯДй. БзЗЏИщ ЖйОюГ ШПј УтНХРЧ БзИВРК РлАЁ РЬИЇРЛ ОВСі ОЪОвДйАэ ДйЗчСі ОЪРЛ АЭРЮАЁ. Бз МіИЙРК РЇДыЧб АэЗСПЭ СЖМБРЧ ЕЕРкБтДТ РхРЮРЧ РЬИЇРЛ И№ИЅДйАэ ДйЗчСі ОЪРЛ АЭРЮАЁ. ШЧИЂЧб БнМгАјПЙЧАРК ОюТю Чв АЭРЮАЁ. ММАшПЁМ АЁРх РЇДыЧб СЖАЂЧАЕщ АЁПюЕЅ ЧЯГЊРЮ ХыРЯНХЖѓНУДы МЎБМОЯРЧ СЖАЂАњ АЧУрРК СЖАЂАЁРЧ РЬИЇЕЕ АЧУрАЁРЧ РЬИЇЕЕ И№ИЅДйАэ ЧбБЙ ЙЬМњЛчПЁМ ДйЗчСі ОЪРЛ АЭРЮАЁ.
УжБй СпБЙПЁМ ЦьГН ЙЬБЙАњ РЏЗДПЁ ЛъРчЧи РжДТ АэЗСКвШИІ С§ДыМКЧиМ УЅРЛ ГТДТЕЅ, УЅ РЬИЇРЬ <Эдеђћў(АэЗСШ)>РдДЯДй. <АэЗСКвШ>АЁ ОЦДеДЯДй. РЬЙЬ ЧЪРкЕЕ БзЗБ СжРхРЛ ЧиПдРИГЊ Бз УЅ РЬИЇРЛ КИАэ БєТІ ГюЖњСіПф. РЬЙЬ СпБЙРК ЙЬМњЛчЧаРЬ ОюЖВ ЧаЙЎРЮСі ОЦДТБИГЊ Л§АЂЧпСіПф. МОчРЧ НУНКЦО МКДчРЧ УЕСЄКЎШИІ КИАэ БтЕЖБГШИШЖѓАэ КЮИЃСі ОЪАэ, ЙЬФЬЖѕСЉЗЮРЧ <ЧЧПЁХИ>ИІ КИАэ БтЕЖБГ СЖАЂРЬЖѓ КЮИЃСі ОЪНРДЯДй. БзЗЏЙЧЗЮ ЧЪРкДТ МЎБМОЯРЧ СЖАЂАњ АЧУрРЛ КвЛѓСЖАЂРЬГЊ КвБГЛчТћРЬЖѓАэ КЮИЃСі ОЪАэ БзРњ ЧбБЙРЧ СЖАЂАњ АЧУрРЬЖѓ КЮИЃАэ РжНРДЯДй. <ЧбБЙ КвБГСЖАЂЛч>АЁ ОЦДЯЖѓ <ЧбБЙ СЖАЂЛч>РдДЯДй. ЙЮШЕЕ ИЖТљАЁСіЗЮ ЙЮШАЁ ОЦДЯЖѓ <ММБтИЛРЧ ЧбБЙШИШ>Жѓ КвЗЏОп ЧеДЯДй. ДыЧбСІБЙРЧ ИъИСАњСЄРЛ АХУФ РЯКЛ АСЁБтНУДыИІ АХФЁДТ ОЯПяЧб НУДыПЁ Рќ БЙЙЮРЬ ЧтРЏЧпДј ИХПь АэТїПјРћРЮ ЧќРЬЛѓЧаРћРЮ ШИШДТ ММАшПЁ РЏЗЪАЁ ОјДТ ЕЖУЂРћ ЧЅЧіЧќНФАњ АэТїПјРЧ ЛѓТЁРЛ КИПЉСжАэ РжДТЕЅ ИєЖѓМАЁ ОЦДЯАэ ТќРИЗЮ ОЫАэ КИДЯ КвАЁЛчРЧЧб БзИВЕщРдДЯДй.
АИЊ РкМі КИРкБт УЄЛіКаМЎ
АИЊ РкМі КИРкБтАЁ ЧЯГЊ РжНРДЯДй. ЙЋОљРЬЕч Нв Мі РжДТ КИРкБтРЬСіИИ, ОЦЙЋ ЙААЧРЬГЊ НЮДТ КИРкБтАЁ ОЦДб ЕэНЭНРДЯДй. ОЦИЖЕЕ ЕўРЬ НУС§АЅ ЖЇ ШЅМіЧАРЛ НеДј КИРкБтАЁ ОЦДбАЁ ЧеДЯДй. БзЗИЕэ ОюИгДЯРЧ СЄМКРЬ Чб ЖЁ Чб ЖЁ МЗС РжДТ АэБЭЧб РлЧАРдДЯДй. БзЗЏГЊ ПЉЗЏ ЛіРИЗЮ МіГѕОЦ ОЦИЇДфСіИИ КЙРтЧЯПЉ ДЋРИЗЮ ЦФОЧЧЯБт ОюЗЦНРДЯДй. ТќРИЗЮ ФЁЙаЧЯАд ЛіНЧРЛ АёЖѓМ ВФВФШї МіГѕРК ЦЏКАЧб КИРкБтРдДЯДй. ПфСђ ЙЎЕц КИРкБтАЁ ИИКДРгРЛ ОЫОЦТїИЎАэ ХЉАд ГюЖѕ РћРЬ РжСіИИ Бз МГИэРК ШЪГЏ ЧЯБтЗЮ ЧеДЯДй. УЄЛіКаМЎЧи КИОЦОп РЬ РкМіКИРкБтРЧ СЖЧќРЬ ОюЖВ ПјИЎПЁ ЕћЖѓ РќАГЕЧОю АЁДТСі ЦФОЧЧи КМ Мі РжНРДЯДй. БзЗЏБт РЇЧиМДТ СЄБГЧЯАд ЙщЙІИІ ЖАОп ЧеДЯДй. Бз ЙщЙІИІ ПУИЎДЯ ПЉЗЏ КаЕщЕЕ УЄЛіКаМЎЧи КИММПф.
Јч ПьМБ НУРлСЁРЛ УЃОЦОп ЧеДЯДй. СпНЩПЁ РлРК ПјРЬ КИРдДЯДй.
ЙйЗЮ КИСжРдДЯДй! Бз КИСжЗЮКЮХЭ ЛчЙцЦШЙцРИЗЮ ПЕБтЙЎРЬ ЛИУФ ГЊАЉДЯДй.
Јш ИеРњ Чб СйИИ УЄЛіКаМЎЧиКИБтЗЮ ЧеДЯДй. СпНЩРЧ КИСжЗЮКЮХЭ ИщиќРИЗЮ ЕШ СІ2ПЕБтНЯРЬ ПЌРЬОю Л§АмГГДЯДй.
Јщ БзЗБЕЅ ЛчЙцРИЗЮ ЛИУФГЊАЅМіЗЯ АјАЃРЬ ГаОюСіЙЧЗЮ СІ2ПЕБтНЯЕЕ ИщиќЕЕ ГаРЬСіАэ ХЉБтЕЕ ФПСіЙЧЗЮ
ФЁЙаЧЯАд АшЛъЧЯИщМ ПЕБтЙЎРЛ МіГѕОЦОп ЧеДЯДй.
ИЖФЇГЛ Бз ПЕБтЙЎ ГЁПЁМ ЧЯГЊРЧ РлРК ПЕСЖжФ№шАЁ ПЕБтШЛ§жФбЈћљпцЧеДЯДй.
РЬУГЗГ ПЕБтШЛ§РЧ БЄАцРЛ КаИэШї КИПЉСжДТ СЖЧќРЬ РжРЛБюПф.
БзЗЁМ ЙЮШАЁ ОюЗЦБтЕЕ ЧЯСіИИ ПЕБтШЛ§РЛ РЇДыЧб СЖЧќРИЗЮ СЄШЎШї ЧЅЧіЧЯАэ РжОюМ ЧзЛѓ АЈХКЧЯДТ АЭРдДЯДй.
БзЗБЕЅ ЖЧ ДйИЅ ЕеБй И№ОчРК ЙЋОљРЮСі ОЦСї ЙрШїСі ИјЧЯАэ РжДй. ООЙц ААРЬ КИРдДЯДйИИ. Рп И№ИЃАкНРДЯДй.
Јъ СпНЩРЧ КИСжЗЮКЮХЭ ЛИУФ ГЊПРДТ ПЕБтЙЎ ЕЮ СйРЛ Дѕ УЄЛіКаМЎЧиКИИщ ДѕПэ КаИэШї ОЫ Мі РжНРДЯДй.
УЙ ЙјТА ПЕБтЙЎРЧ РќАГПЭ ЖШААНРДЯДй. ГЁКЮКаПЁМ ОеПЁМУГЗГ ММ АЅЗЁЗЮ АЅЖѓСіДТЕЅ,
ПоТЪРИЗЮКЮХЭ ХЋ СЖЧќРИЗЮ МіГѕРК ЙЋЗЎКИСжАЁ МкОЦГЊПЭ РЬ ПЕБтЙЎРЬ КИСжИёРгРЛ СѕИэЧЯАэ РжНРДЯДй.
Бз ДйРН ПЕБтЙЎ ГЁПЁМДТ ПЕСЖАЁ ПЕБтШЛ§ЧЯАэ РжНРДЯДй.
Бз ДйРН ПЕБтЙЎЕЕ ПоТЪКЮХЭ ПЕСЖАЁ, Бз ДйРНПЁДТ ХЉБтАЁ РлРК ЕЮ ПЕСЖАЁ ИЖСжКИИщМ ПЕБтШЛ§ЧЯАэ РжНРДЯДй.
Јы БзЗЏИщ РќУМИІ УЄЛіКаМЎЧи КИАкНРДЯДй.
РќУМРћРИЗЮ ЛьЦьКИИщ КИСжПЁМ ЛчЙцЦШЙцРИЗЮ ЛИУФГЊАЁДТ ПЕБтЙЎРК И№ЕЮ 8АГРдДЯДй.
БзЗБЕЅ ЛчЙцРИЗЮ ХЋ ЙЋЗЎКИСжИІ ЧЅЧіЧЯПЉ РќУМПЁ СњМИІ АЎУпАд ЧеДЯДй.
8АЅЗЁРЧ ПЕБтЙЎРК ДйНУ РлРК 3АЅЗЁЗЮ АЅЖѓСіДТЕЅ Бз АЅЖѓСіДТ АїИЖДй ПЕСЖПЭ
ЙЋОљРЮСі И№ИІ ГЊКё ААРК И№Оч, БзИЎАэ ЕеБй ООЙц ААРК И№ОчРЬ ПЕБтШЛ§ЧеДЯДй.
ТќРИЗЮ ГюЖѓПю СЖЧќРИЗЮ ДмСі ВЩАњ ЛѕАЁ ОЦДеДЯДй.
КИСжЗЮКЮХЭ ЙпЛъЧЯДТ АЗТЧб ПЕБтЙЎПЁМ ИИЙАРЬ ШЛ§ЧЯДТ ИИЙАЛ§МКЕЕиПкЊпцрїгёРдДЯДй.
Јь УЄЛіКаМЎЧб АЭРЛ ЙнРќНУХАИщ КаРЇБтГЊ ДРГІРЬ ДйИЃАэ ШЏЛѓРћРдДЯДй.
ЙйЗЮ ИИДйЖѓЗЮ КЏНХЧеДЯДй.
Јэ БзЗЏИщ ИщРИЗЮ ЕШ ПЕБтЙЎРИЗЮ МБрЪРИЗЮ ЙйВйОю КИИщ ДѕПэ КаИэЧиС§ДЯДй.
ПьМБ КЮКаРЛ БзЗИАд ЙйВйОю КИАкНРДЯДй.
БзЗЏИщ ПЕБтЙЎРЧ РќАГПјИЎИІ СЛ Дѕ НБАд ЦФОЧЧи КМ Мі РжБт ЖЇЙЎРдДЯДй.
БзИЎ ОюЗСПю АЭРЬ ОЦДЯДЯ ПЉЗЏКаЕЕ БзЗСКИНУБт ЙйЖјДЯДй.
Јю РќУМИІ МБРИЗЮ ЙйВйОњНРДЯДй.
БзЗЏДЯБю СпНЩРЧ КИСжПЁМ 8АГРЧ КИСжИёРЬ ШЛ§Чб БЄАцРЛ РЬЗИАд ЧЅЧіЧпАэ
ГЁРЧ АЁСіИЖДй ДйИЅ И№ОчРЧ ПЕСЖЕщРЬ БъЕщАэ РжАэ, ГЊКё И№ОчЕщЕЕ ГЏАэ РжНРДЯДй.
ЧіНЧРћРИЗЮ ЙйЖѓКИИщ РЬЗИАд МГИэЧв Мі РжСіИИ, ЧЪРкРЧ РЬЗаРИЗЮ ЙйЖѓКИИщ
КИСжПЁМ ГЊПТ ПЕИёжФйЪРК КИСжИёРЬ ЕЧОю ИИЙАРЬ ШЛ§ЧЯДТ ИИЙАЛ§МКЕЕАЁ ЕЧДТ АЭРдДЯДй.
Јя БзЗИАд УЄЛіКаМЎЧб АЭРЛ ЙнРќНУХАИщ ДѕПэ ЦФОЧРЬ НБАэ ШЮОР ШЏЛѓРћРдДЯДй.
АИЊ КИРкБтДТ ЦђЙќЧб КИРкБтАЁ ОЦДеДЯДй. КИСж ОШПЁ АЁЕц УЁДј МіГѕРК РЯУМАЁ КИСж ЙлРИЗЮ ЛИУФ ГЊПЭ ИИЙАРЬ Л§МКЧЯДТ РхАќРЛ РЬЗчДТ И№НРРдДЯДй. РЬЗЏЧб РкМіБзИВРК КаИэШї ЙЮШ РлАЁАЁ ЙиБзИВРЛ БзЗССсРНПЁ ЦВИВОјНРДЯДй. ЧЪРкДТ ММАшЙЬМњРЛ МЗЗЦЧи ПТСі ПРЗЁ ЕЧОњРИГЊ РЬЗБ АэТїПјРЧ СЖЧќАњ ЛѓТЁРЛ ЧЅЧіЧб РлЧАРЛ КЛ РћРЬ ОјНРДЯДй. РЬЗБ АцРЬРћРЮ СЖЧќРК ОЦЙЋГЊ Л§АЂЧи ГЛАХГЊ БзИЎСі ИјЧеДЯДй. АИЊСіЙцРЧ РЬИЇ АЈУс ЙЮШ РлАЁАЁ ЙиБзИВРЛ БзЗССжОњДйАэ ШЎНХЧеДЯДй.
.............................................
ЕПОчРкМіЙкЙААќ МвРхРЏЙАРЮ АИЊМіКИ 1СЁПЁ ДыЧб
УЄЛіКаМЎРкЗсАЁ АПьЙцПјРхДдРЧ ОЦЗЁ КэЗЮАХ СжМв
ПЁ ПУЖѓПЭ РжНРДЯДй. ТќАэЧЯНУБт ЙйЖјДЯДй.
http://blog.daum.net/ilhyangacademy (АИЊКИРкБт 3)